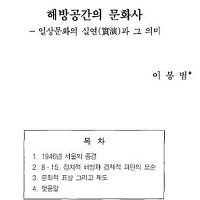재앙에 맞서는 반란
- 하인리히 클라이스트, 『미하엘 콜하스』(황종민 옮김, 창비)
이 종 현/수유너머N 회원

하인리히 클라이스트(1777-1811)는 독일의 작가다. 고전주의에도, 낭만주의에도 속하기 원치 않았던 그는 많지 않은 소설과 희곡을 썼다. 독일문학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괴테나 카프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클라이스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독문학자 볼프강 보이틴은 <독일문학사>에서 카프카 산문의 특수성으로 꼽히는 ‘간결하고 극적인 형식과 표면적인 객관성’이 사실은 클라이스트에게서 먼저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클라이스트는 카프카의 직속 선배인 셈이다. 또, 괴테는 클라이스트의 희곡 <깨어진 항아리>를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연출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클라이스트는 ‘연출가’ 괴테에게 대본을 넘긴 ‘작가 선생님’이셨던 셈이다. 괴테와 카프카에게 이 정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니 클라이스트를 한 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든다.
클라이스트를 처음 안 것은 석사논문을 쓰면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잡글들을 모조리 읽어보려는 마음을 먹었다가 그 목록에서 <하인리히 클라이스트>(1941)라는 짧은 글을 봤을 때였다. 그때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 그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억 속에 두지도 않았다. 그런데 한 일 년쯤 지났을까, 오에 겐자부로의 <아름다운 애너벨 리 싸늘하게 죽다>(2007)라는 소설을 읽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를 영화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클라이스트라는 이름을 다시 접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의 작품들을 찾아 읽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불현듯 ‘빌린 책’이라는 컨셉으로 간단한 서평 같은 것을 써 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역시 그때 벼락을 맞은 듯 나는 클라이스트를 떠올렸고 써보겠다고 했다. 나는 이 책을 빌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컨셉이 불분명한 어떤 기획이 제공한 기회를 ‘빌어’ 이 책을 읽었다고 할 수는 있다.

클라이스트는 35년 밖에 살지 않았다. 그는 암에 걸린 애인 헨리에테 포겔과 호수 근처에서 권총으로 동반 자살했다. 그의 죽음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 그의 소설들도 그다지 사실관계, 인과관계에 충실하지 않다. <칠레의 지진>이라는 단편소설에서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무너지는 난리에 간통죄로 서로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난다. 그렇게 폐허 속에서 사건들이 벌어지다가 두 사람 모두 맞아 죽는다, 번역본으로 네 쪽 밖에 되지 않는 <로까르노의 거지 노파>라는 작품에서는 후작 부인의 호의로 보호받던 거지 노파가 사냥에서 돌아온 후작의 호통 소리에 놀라 자빠져 죽어버리고, 후작은 그 노파의 유령에게 시달려 결국 성에 불을 질러 자살한다. 대표작인 노벨레 <미하엘 콜하스>에서는 말장수인 주인공 콜하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 귀족의 변덕 때문에 국경을 넘지 못해 사업을 망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건 때문에 아내까지 잃은 그는 농민 봉기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 농민 봉기는 어이없게 등장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중재로 사그라들고 콜하스 역시 참수 당한다.
‘소설(小說)’이라는 말은 그대로 풀어보면 ‘작은 이야기’다. <태백산맥>과 같이 긴 소설도 있으니 ‘작다’라는 말은 분량에 따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는 서사시나 비극, 인간 내면의 깊음을 전하는 서정시와 다르게 소설의 ‘작음’은 인간의 ‘보잘것없음’에 방향 잡혀 있다. 웅대한 세계에 비해 한없이 ‘작은’ 소설의 인간은 그 세계 안에서 복작대며 살아간다. 그런데 소설의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규정과 다르게 클라이스트의 주인공들은 상당히 ‘크다.’ 내가 읽어 본 클라이스트의 소설들 몇 편에서 주인공들은 애초에 하나같이 멀쩡하며 고결하다. 그런 주인공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떨어지고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재앙과 맞서거나 재앙을 활용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봉기도 일으키고, 부동산 업자를 찾아 성을 팔려고도 하며, 종교에 의탁하기도 한다. 그들의 방식은 고대 비극의 고귀한 영웅들이 그 넘치는 잘난 체를 주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 신벌과 훌륭히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클라이스트의 주인공들은 더 이상 운명과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부르주아의 방식으로 협상도 해 보고 타이르기도 한다.(그 예외는 ‘성인전설’이라는 부제가 붙은 <성 체칠리아 또는 음악의 힘>이다.) 그래도 안 되면 죽음의 구렁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약 올리거나 쌍욕 한다. "삶에 진저리치며, 벽이란 벽이 모두 판자로 덮여 있는 성 구석구석에 불을 붙였다.“(<로까르노의 거지 노파>)
나에게 재앙이 닥친다면, 나 역시도 온갖 협잡과 방법을 다 해서 그것을 막아내려 노력할 것이다. 그래도 사태가 안 풀린다면, 나는 조용히 눈 감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조롱하며 미하엘 콜하스처럼 세상의 비밀이 적힌 쪽지를 참수 직전에 삼켜버릴 것인가. 클라이스트의 작품집은 황당한 스토리 전개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적어도 비현실적인 파국의 운명을 즐길 수는 있게 해준다. 아, 그리고 클라이스트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이 지난 한 달가량 서울에서 상영된 바 있다.
'리뷰_철학.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학에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수학의 언어> (2) | 2014.04.02 |
|---|---|
| [수유너머N이 추천하는 말과 글] 두 번째: 사실 너머의 사실들 (1) | 2014.03.31 |
| [수유너머N이 추천하는 말과 글] 첫 번째 (2) | 2014.03.11 |
| 가난에 대한 두꺼운 기록 <사당동 더하기25> (2) | 2014.03.08 |
| 무문자사회와 문자사회 (0) | 2011.08.08 |